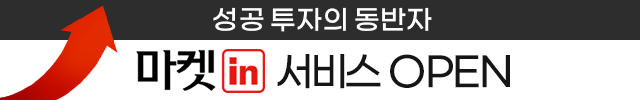|
지난 2월 개봉 이후 50만 관객 돌파를 앞둔 ‘퇴마록’(감독 김동철)은 20년 이상 애니메이션 시장에 몸담은 홍 대표의 업력과 철학을 담은 결실이다. ‘퇴마록’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퇴마사들이 절대 악(惡)에 맞서는 대서사의 시작을 담은 오컬트 블록버스터다. 1993년 발간돼 누적 1000만 부를 달성한 이우혁 작가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했다.
그간 국산 애니메이션은 뽀로로, 신비아파트, 점박이 등 유아용 작품을 제외하면 국내 박스오피스에서 늘 찬밥 신세였다. 실사영화처럼 배우 인지도에 기댈 수 없고, 디즈니, 픽사 등 해외 애니메이션에 비해 관객 관심도도 낮았다. 반면 ‘퇴마록’은 개봉 당시 ‘미키 17’, ‘캡틴 아메리카’ 등과 맞붙는 최악의 대진운에도 장기간 박스오피스 상위권을 지키는 ‘이변’을 일으켰다.
한국 애니메이션 최초로 오스카 장편 애니메이션상 후보에 오른 ‘레드슈즈’와 이번 ‘퇴마록’을 제작한 홍 대표는 디즈니와 픽사, 소니 등 대형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보유한 미국, 지브리를 보유한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 애니 시장의 발전이 어려운 이유로 ‘인프라의 부재’를 꼽았다.
그는 “극장의 매출 점유율을 전 세계 기준으로 살펴보면 애니메이션 작품의 점유율이 무려 20%를 차지한다”며 “1년에 유통되는 애니 작품 수가 전 세계적으로 100편도 채 안 된다. 그 적은 작품 수로 매출의 20%를 차지하니 굉장히 효율이 좋은 거다. ‘이렇게 시장이 좋은데 우리나라는 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
한국은 K웹툰, K웹소설 등 뛰어난 지식재산권(IP)들이 많기에 국내 애니 시장이 성공할 재료, 기술력은 충분하나 정부 지원 제도 등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국은 IP 소유권을 가진 주체의 힘이 정말 세다. 또 IP를 바탕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 제작사가 비용 등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라며 “정부 지원 역시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한국의 제도는 차이가 있다”고 꼬집었다. 미국과 일본 등 애니산업 선진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경쟁 입찰 등의 제한 없이 애니 작품을 제작할 시 파격적인 세제지원 혜택을 주거나 적게는 25%, 많게는 43%까지 정부가 제작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반면 한국의 애니 제작 지원은 대부분 한정된 예산을 쪼개 경쟁 입찰 방식을 거쳐 발탁된 여러 작품들에 지원비를 대주는 등 상대적으로 보수적 방식을 취하고 있단 설명이다.
최근 영화관 등 콘텐츠 산업에 충성 고객 등 팬덤 소비의 영향력이 점점 확산되고 있고, 팬덤을 보유한 IP와 콘텐츠, 게임산업 등을 결합한 부가 사업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도 진단했다. 홍 대표는 “이미 미국, 일본, 중국 등과 비교하면 한국은 후발주자에 해당하지만, 지금이라도 이 기회를 제대로 잡아야 한다”며 “현재 국내의 문화산업 지원 제도는 전통 제조업 기업들의 지원과 지역 균형 발전을 결합한 ‘공장 이전’과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양한 트렌드와 문화를 민감히 향유해야 할 콘텐츠 산업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지원제도에서부터 패러다임 변화가 절실하다”며 “무엇보다 국내 애니 산업이 발전하려면 대학을 만들고 인재를 양성하기 이전에 이 인재들이 충분히 현장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작품) 수가 많아져야 한다. 작품 활동이 활발해져야 기술 발전도, 인력 양성도 가능한데 지금의 제도는 주객이 전도돼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또 “우리 관객들은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하며 이미 안목이 뛰어나졌고, 좋은 작품이 나온다면 국산 애니라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라며 “뛰어난 콘텐츠가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이 변화를 사기업들이 혼자서 감당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