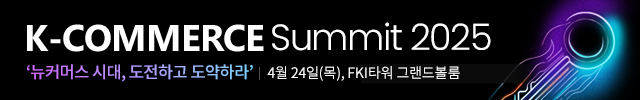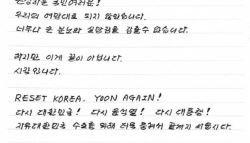캐나다인들이 미국행 휴가 계획을 잇따라 보이콧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캐나다 국민들의 반발이 확산한 영향이다.
|
◇트럼프 ‘51번째 주’ 발언에 “美서 돈·시간 쓰기 싫어”
시장분석업체 스태티스틱스 캐나다에 따르면 지난달 캐나다 거주자가 항공편을 이용해 미국을 여행한 횟수가 1년 전보다 1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육로를 통해 국경을 통과한 횟수도 23% 줄었다.
미국 연방 항공여행 데이터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확인된다. 지난달 라스베이거스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캐나다인 수는 전년 동기대비 9.4%, 뉴어크·뉴욕 공항을 통한 입국자 수는 11% 각각 감소했다. 지난해 미국을 방문한 캐나다인은 2200만명으로, 캐나다 전체 인구(약 3974만명) 대비 55%가 넘는다.
WSJ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이후 쥐스탱 트뤼도 전 캐나다 총리는 자국민들에게 미국 대신 국내 명소로 휴가를 떠날 것을 권고했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며 “관세 위협보다는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州)로 편입시키겠다는 발언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엔 그린란드에 대한 지속적인 야욕과 더불어 캐나다 여배우가 입국을 거부당해 12일 동안 구금당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캐나다인들을 더욱 격노하게 만들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애나 켈리 백악관 대변인은 “캐나다인들이 우리의 소중한 51번째주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이 되면 더 이상 해외 여행의 불편함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해 기름을 부었다.
캐나다인들의 미국 여행이 줄어들 조짐이 확인되면서 캐나다 항공사들은 오는 4~6월 미국행 좌석 수용 인원을 지난 1월 31일 대비 평균 6.1% 줄였다. 실례로 플레어 에어라인은 다음 달 밴쿠버, 에드먼튼, 캘거리에서 피닉스로 향하는 항공편을 중단하고, 연내 토론토에서 내슈빌로 가는 계절 노선도 재개하지 않기로 했다.
웨스트젯은 “캐나다 여행객들이 미국에서 멕시코와 카리브해와 같은 다른 목적지로의 예약을 변격하는 것이 목격됐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각종 행사 역시 취소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
◇유럽인들도 미국 여행 기피…美소비·일자리엔 악재
캐나다 국민들 뿐 아니다. 유럽 여행객들 역시 미국 방문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미국 국립 여행·관광청(NTTO) 데이터를 인용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미국을 찾은 서유럽 관광객 수가 전년 동기대비 1%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율이 14%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180도 달라진 것이다.
특히 관광객이나 그린카드 소지자마저 장기간 구금을 당했다는 소식은 여행객들이 시간이나 돈을 쓰기 위해 미국 국경을 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
외국인 방문객이 줄어들면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 여행협회는 캐나다인들의 미국 방문이 10% 줄어들 경우 소비지출이 20억달러(약 2조 9400억원) 감소하고, 1만 4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추산했다.
캐나다와 인접한 지역 경제 역시 위기에 봉착했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위치한 버팔로 카운티 연간 방문객 가운데 30~40%가 캐나다인인데, 인근 4개 다리의 지난달 교통량이 전년 동월대비 14%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