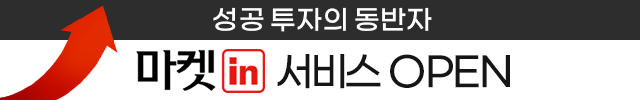|
이번 심포지엄은 정책 제언과 전문가 패널 토론을 통해 제도 개편의 실효성과 구체적 실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병덕 의원은 자산 편중, 저성장, 고령화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생산성 제고와 국민소득 증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해법은 자본시장을 통한 효율적 자금배분과 장기투자 기반 확립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1500만명에 달하는 투자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본시장 활성화는 밸류업(기업가치제고)과 더불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더욱 단단하고 지속가능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제언이 나왔다. 이정수 서울대 교수는 “기업금융의 효율화,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도 “국회 입법이 필요하거나 이해관계 충돌이 첨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과제를 고안하기 보다는 진행 중인 것에 대해 최대한 빨리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 내 제도화 하고, 이미 법·제도화 된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일본의 주가순자산비율(PBR) 개혁 등을 사례로 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활성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에 묶인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개선, 토큰증권 활성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거래소 상장유지조건 강화 및 좀비기업 퇴출, 금융당국의 기소권·강제수사권 등 권한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시장 구조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이어졌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AI 플랫폼 등 전략산업에 대한 공격적 자금 유입 필요성을 제시했고,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행동주의 펀드와 주주소송 활성화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는 “국내 투자를 통해서도 국민 자산 증대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중복상장을 해소하고 양질의 기업들이 상장시장을 통해 성장하도록 시장의 질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수 하나금융연구소 소장은 토큰증권발행(STO) 활성화와 부동산 쏠림 해소를 위한 정책 고도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