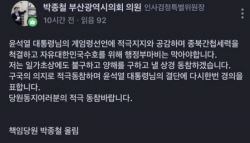7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서 반고체, 전고체와 함께 나트륨이온배터리를 차세대 배터리로 정의했다. 나트륨이온배터리는 1970년대부터 리튬이온배터리와 함께 개발됐만, 에너지밀도가 현저히 낮다는 기술적 한계로 시장에서 외면받아 오다가 최근 들어 중국 업체들을 중심으로 전기차 제조 비용을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다시 개발되기 시작했다.
|
BYD도 산하 배터리업체인 핀드림스를 통해 저속전동차 제조기업인 후아이하이 홀딩스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소형 전기차용 나트륨이온배터리 양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재 BYD가 양산 중인 나트륨이온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kg당 140Wh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에서는 나트륨이온배터리가 국내 업체들이 강점을 보여온 하이니켈 NCM(니켈·코발트·망간) 삼원계 배터리를 밀어내고 시장에서 주축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당장은 기술적인 한계로 저에너지밀도 중심의 시장, 즉 납축전지나 LFP 배터리가 쓰이던 시장을 양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나트륨배터리는 에너지밀도가 낮고 수명이 짧다는 점이 최대 약점으로 꼽힌다. 나트륨이온 반경이 커서 흑연 음극재와의 결합이 구조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나트륨이온배터리 에너지 밀도는 1kg 당 100~140Wh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는 에너지 밀도가 낮다고 알려진 LFP(150~180Wh)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상용화가 이뤄져도 주로 저속전기차나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같은 영역에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NCM 배터리는 통상 에너지밀도가 kg당 200~300Wh 정도다. 완성차 업계에서도 엔트리 모델보다는 고급 차종이나 대형 픽업트럭 등에 주로 활용한다. 미국 국민 픽업트럭 ‘F-150라이트닝’에 니켈 함량이 약 90%인 SK온 NCM9 배터리가 탑재된 것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한계에도 나트륨이온배터리가 지속 개발되는 건 원료인 소듐의 매장량이 리튬 대비 충분하기 때문이다. 리튬이나 니켈, 코발트와 같은 희소 광물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 양극재 원가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고온 안전성이 높다는 점 역시 LFP 배터리와도 유사한 특성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나트륨이온배터리 상용화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지적한다. 윤성훈 중앙대 융합공학부 교수는 “나트륨이온배터리의 원료인 소듐은 폭발성이 강해 리튬과 차원이 다른 안전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중국이 발표한 시제품에서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지만, 앞으로 5년 내에 상용화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리튬 등 광물 부족 문제 역시 전기차 보급이 확산한 미국이나 유럽에서 폐배터리 재활용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리튬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전기차 제조 공정이 확립된 상태에서 소듐으로 대체했을 때 어떤 강점이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문도 있다”고 분석했다.

![[속보]한동훈 “대통령 탈당 다시 요구…제가 책임지고 사태 수습”](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0500368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