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에게 있어서 산학협동은 괜찮은 학생들을 나중에 회사로 데려와 길러 쓰기 위한, 또는 사회공헌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수단에 가깝다. 교수들에게 있어 산학협동은 학생들의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댓가로 연구비를 타내서 실험실을 운영하는 방편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기업과 대학이 공생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먼저 기업들의 관심사에 눈높이를 맞춰야 합니다. 교수들이 기업들을 찾아가 대학과 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기업들이 생산현장에서 느끼는 고민을 대학이 해결해 주는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
'대학이 먼저 변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마이클 이안 셰이모스 교수(56세·사진)는 카네기멜론대학 공대학장을 거쳐 컴퓨터사이언스학과의 책임교수로 일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와 각 부처의 정보책임자(CIO)를 교육하는 일에서부터 인터넷 비즈니스와 관련된 예민한 특허분쟁의 자문위원 역할까지 1인 다역을 소화하는 셰이모스 교수는 e비즈니스의 흐름을 최일선에서 접하고 분석하는 '살아있는 전문가'다. 현장의 고민을 학생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는 교수가 그 현장에 촉수를 뻗고 있어야 한다는 지론이다.
전세계 e비즈니스의 흐름을 읽고 학생들에게 e비즈니스의 다양한 이슈를 가르치는 게 그의 일이지만, 그가 가장 힘을 쏟는 부분은 그 중에서도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지식'을 전해줄 기업의 사례를 찾는 일이다. 학생들에게 적당한 연구과제를 기업들과 끊임없이 논의하고 기업이 현장에서 풀기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학생들에게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게 유도해 해법을 찾아낸다.
작년에 강의했던 노트를 올해도 그대로 써먹는 고전적인 강의 방식이 교수에게는 한가롭고 편리하다는 것을 그 역시 잘 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그러지 않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셰이모스 교수는 세가지 이유를 꺼내든다.
"카네기멜론 대학은 다른 대학과는 달리 현장과 직결되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중시하고 이를 연구하는 실용주의 학풍이 강합니다. 기업들과 매년 수십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기업들에게는 문제 해결의 단서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는 현장의 분위기와 관련 기술들을 체득하게 하는 방식이죠"
두번째 이유는 학생들이 현장 중심적인 학습을 원하기 때문이란다.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등 이름 하나로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많은 것을 감수하게 만드는 그런 브랜드를 갖고 있지 못한 대학은 하버드나 예일대가 주지 못하는 다른 것을 제공해야 학생들을 모을 수 있다. 카네기멜론대의 학생들은 대부분 이런 현장 중심의 살아있는 교육을 받기 위해 지원한 학생들이다.
카네기멜론대학에는 한국학생들 20여명이 외국 학생들과 섞여 단체로 수업을 듣는 특별한 코스가 있다. 'eBusiness MSIT'라는 1년 코스의 단기 석사과정이다. 4000만원 가량의 등록금 가운데 절반을 무역협회가 지원하는데, 국내 유수 기업들의 IT 전문가들이 매년 4대1에 가까운 경쟁률을 기록하며 앞다퉈 지원서를 낸다.
이 과정을 수강중인 한 한국학생은 "IT업계의 다양한 이슈와 고민들을 실제 사례와 연결해서 팀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식이 1년내내 진행된다"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토론하며 해결하다보면 그 분야의 지식이 저절로 습득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셰이모스 교수가 현장 중심의 산학협동 프로젝트에 열을 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학이 처한 현실 때문이기도 하다. 매년 이 대학의 예산은 7억달러 정도지만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해결하는 부분은 1억5천만달러 남짓이다.
1억달러 정도는 2조원 가량확보된 대학기금의 운용수익으로 충당하지만 4억 달러 이상의 모자라는 부분은 기업이나 정부기관들의 프로젝트를 따내서 조달해야 한다. 교수들이 뛸 수 밖에 없고, 뛰는 교수들이 인정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미국의 많은 대학들도 아직은 상아탑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학술 저널에 기고하는 방식의 학문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카네기멜론의 문화는 좀 다르죠. 교수들을 채용할 때도 현장의 경력을 중시하고 기업들과 얼마나 많은 교류를 통해 학생들의 연구활동에 도움을 주느냐가 교수들의 평가기준이 됩니다."
셰이모스 교수의 '대학이 변해야 한다'는 조언은 좀 더 파고들면 '교수들이 변하고 대학의 행정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런 현실을 두고 우리나라 대학들은 다르게 대처한다. 필요한 돈은 7억달러인데 등록금과 정부지원금은 2억5천만달러에 불과하다면, 우리 대학들은 어떻게 대응할까. 우리는 기꺼이 예산을 2억5천만달러에 맞추는 쪽을 택한다.
책도 적게 사들이고 투자 규모도 줄이고 적은 연봉으로도 기꺼이 강의를 할 교수를 골라 뽑는다. 한국의 일류대학이 미국에 오면 100등 이후로 밀리는 이유가 자명해진다.
셰이모스 교수는 피츠버그에 기반을 둔 알루미늄 기업 '알코아'가 카네기멜론대학과의 산학협동 프로젝트를 통해 효과적인 제품 배송추적 시스템을 갖추게 된 사례를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그리고 그 비결을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교수들이 지난 30년동안 꾸준히 알코아와 접촉해왔고,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업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는 것을 지역신문들이 자세히 자주 소개해줬고, 우리는 우리스스로 그런 프로젝트의 성공들을 학술저널에 실린 논문들보다 더 높이 평가합니다. 그게 다른 대학과 우리의 차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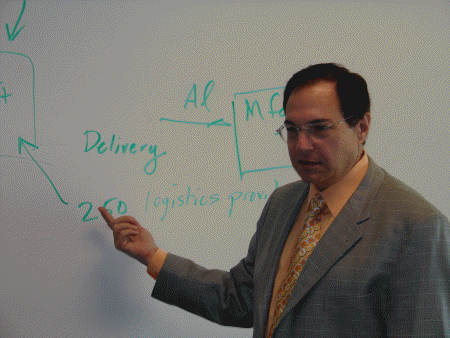




![한 놈만 아득바득 이 갈던 명재완에...별이 졌다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2/PS26021000001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