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규(51)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본사에서 기자들과 두 시간 반 동안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장 의장은 1996년 네오위즈를 창업한 후 첫눈, 본엔젤스파트너스, 블루홀 등을 거쳐 2018년부터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장 의장은 “단기적 투자를 하는 주주들을 위해서는 사실 대응이 어려운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상장 후 2년이 지난 지금도 공모가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잊지 않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
실제로 크래프톤(259960)의 주가는 작년 17만 원대에서 현재 23만 원대로 상승했지만, 갈 길이 멀다. 2021년 7월 29일 공모가 49만8000원으로 상장했는데, 공모가 기준 상장 후 시가총액은 24조3512억원이었다. 현재 시총(11조 4624억원)의 두 배 이상이다.
장 의장은 공모가 회복이란 자신감의 근거로 △글로벌이란 키워드 △7년 동안 흔들리지 않는 배틀그라운드 IP의 경쟁력, 그리고 프랜차이즈화 △조직구조 혁신에 따른 성장의 선순환을 언급했다.
또한, 이를 무기로 올해부터 비(非)게임 분야를 포함해 사업을 다각화하겠다고 밝혔다. IPO(기업공개)를 통해 확보한 3조원 넘는 현금성자산을 기반으로 대규모 인수합병(M&A)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장병규 의장은 “크래프톤이 변화하고 있다고 많이 느낄 수 있다. 주주들도 놀라실 수도 있다”며 “작년까지만 해도 팔고자 하는 곳과 가격대가 안 맞았는데 요즘은 해볼 만한 수준이 된 것 같다. 코어 비즈니스와 여러 가지가 정돈됐으니 본격적으로 다각화를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M&A는 내수 산업이나 제조업이 아닌 글로벌 및 신기술 접목이 가능한 분야일 것으로 보인다. 그는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소프트웨어, AI 관련 기업을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크래프톤은 지난해 스타트업 지주사 ‘패스트트랙아시아’에 220억원을 투자해 지분 27.47%를 확보했으며, 이런 기조가 올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장병규와 크래프톤의 공통점은 글로벌
그는 “제가 블루홀을 시작한 이유는 게임을 좋아하거나 게임 만드는 걸 좋아해서는 아니다”라며 “원화가 아니라 달러를 벌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장병규와 크래프톤의 공통점은 글로벌”이라고 회고했다. 또 “감사하게도 인도 국민과 인도 정부가 저희를 받아들여 주셔서 이제 인도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이건 누구도 안 가본 길을 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배틀그라운드’ 지식재산(IP)에 대해서도 확신했다. 그는 “2년 전에는 라이프 사이클이 짧지 않겠냐는 비판이 있었지만 꽤 오랫동안 펍지가 돈을 벌 것 같다는 건 인정해 주시는 것 같다”면서 “스팀이라는 플랫폼 동시 접속자 최고 기록은 펍지(PUBG) 배틀그라운드인데, 7년 동안 변한 적이 없다. 스팀 역사상 최고 기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어떤 관점에서 보면, 어떤 크리에이티브가 들어왔을 때 1이라는 게 있어 0에서 10을 만드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라면서 “이처럼 조직이 가진 자산이 점점 쌓이는데, 잘된 선순환을 그리면 정말 큰 회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게임 업계에서 플랫폼을 빼고 보면 EA(일렉트로닉 아츠)가 한 때 잘나갔을 때 시총 50~60조 정도 했다”면서 “EA 정도 이상은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기대가 점점 생기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
배틀그라운드 지속 성장 열쇠는 프랜차이즈화
장 의장은 “매달 지표를 보면 펍지는 좀 오랫동안 갈 만한 기반이 생겼다”면서도 “프랜차이즈화를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 작년부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프랜차이즈화란 동일한 IP를 다양한 스튜디오에서 만든다는 개념이다. 그는 MS(엑스박스), 소니(플레이스테이션)를 제외하고 게임 제작사 및 퍼블리셔로서 가장 성공적인 건 ‘콜 오브 듀티(Call of Duty)’라고 했다.
그는 “MS가 높은 가격에 인수했고, 콜 오브 듀티를 만드는 스튜디오는 약 12개쯤 될텐데, 찐팬을 빼면 대부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고 콜 오브 듀티 시리즈를 구매한다. 콜 오브 듀티와 관련된 배틀로얄 모드나 라이브 서비스도 한 IP 산하에 넣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펍지 프랜차이즈는 펍지 IP(배틀그라운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제작사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IP 중심으로 다양한 플랫폼과 게임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조직적으로는 특정 개인에 의존하지 않고 오랜 기간 지속 가능한 조직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이다. 우리는 이를 ‘스케일업 더 크리에이티브’라고 부른다. 20~30년 동안 지속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주주 관점에서 완전히 다른 회사로 발전할 것이다. 외부 스튜디오와도 파트너십을 통해 이러한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의장은 “전세계 어디 가도 맥도날드가 있지만, 누구나 봐도 펍지, 콜 오브 듀티와 맥도날드가 같다고 생각하긴 어려울 것이다. 우리도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 어려운 길을 가기 위한 결단을 했다”고 덧붙였다.
펍지의 프랜차이즈는 콘솔 고객을 위한 대변혁에서 시작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그는 “펍지가 PC에선 강하고 콘솔에선 약하다고 느끼고 있다. 엑스박스와 플레이스테이션에는 서비스를 론칭했지만 성적이 아주 좋지는 않다. 콘솔 플랫폼에서의 대변혁이 필요하다. 프랜차이즈화는 콘솔 고객을 위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PC 사용자는 따로 컴퓨터를 앉아 사용하지만 콘솔 사용자는 소파에 앉아 한다. 콘솔 유저들에게 맞춘 형태의 펍지 IP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게임의 미래는 글로벌, 균형 있게 다뤄야
장 의장이 글로벌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우물 밖에 더 큰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는 “시장 크기를 북미, 유럽 서구권, 한국, 일본, 중국, 인도로 나눠 볼 때, 한국이 넘버 원 시장은 아니다. 앞으로 성장할 시장의 고객이 무엇을 바랄지를 파악해야 이 산업에 미래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관점에서 (외부에서 볼 때) 크래프톤은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고 다양한 시장에 진출하며, 장르도 다양한 것으로 언급된다”면서 “ 고객들이 그런 다양성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게임사 경영은 난이도가 높다고도 했다. 그는 “다양한 분야를 탐험하는 것은 까다로운 일이다. P2W(Pay to Win)MMORPG와 배틀그라운드, 인조이 같은 라이프 시뮬레이션 게임을 잘하는 역량과 경험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다르고 고객군 역시 다르다”면서 “그래서 경영진과 팀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지만, 생각보다 어렵고 힘든 일이다. 요즘 게임은 수백억의 예산이 소요되며, 차세대 그래픽이라 하면 수십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살이 떨린다. 결국 고객들로부터 해답을 찾아야 하며, 고객을 고려할 때 글로벌 시장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크래프톤도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부터 ‘스케일업 더 크리에이티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1년 동안 조직이 일치되고 있으며, 지금도 그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이 장르를 하자, 이런 건 없다. 세계적으로 크리에이티브를 발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
GDP 7~8% 성장하는 인도, 韓게임 가능성 크다
크래프톤은 지난 2월 데브시스터즈와 모바일 게임 ‘쿠키런’의 인도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 버전의 흥행 노하우를 바탕으로 쿠키런의 현지 서비스를 이끌고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쿠키런은 2013년 카카오 플랫폼을 통해 첫선을 보인 이래 국내외 누적 다운로드 1억 건을 넘어선 IP다.
그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의 과금 모델은 여타 지역의 과금 모델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인도는 1달러짜리 소액 결제 모델이 있다. 이는 인도 고객들은 게임에 돈을 사용할 때 제공되는 효용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시장과 고객이 게임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인도는 GDP가 7~8% 성장하니 앞으로 게임에 돈을 쓸 것 같은 사람이 많은 시장”이라고 했다.
또 “쿠키런도 인도 고객들이 게임을 쉽게 수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인도는 볼리우드(인도 뭄바이의 인기있는 영화 산업을 일컫음) 같이 자국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면서 “로드투발러나 신작(가루다 사가: 서드파티게임)도 인도향을 많이 담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또 인도는 스마트폰 스펙이 낮다. 그래서 저사양폰에서도 잘 돌아가야 한다. 미국이나 서구, 한국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크래프톤은 인도 게임 인큐베이팅 ‘KIGI(KRAFTON INDIA GAMING INCUBATOR)’를 통해 인도의 게임 생태계를 지원하고 있다.
장 의장은 “한국에서 1990년대 후반 ‘카이스트나 나와서 게임 만들고 있냐’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인공위성을 만든다면 오~하고 반응했지만. 인도로 치면 IIT(인도 공과대학교) 나와 게임이나 만들어? 하는 게 된다”면서 “한국도 선진국이 돼 가면서 여가 생활이나 개인의 존중이 나오지 않았나. 인도 역시 게임 산업이 발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크래프톤은 2PP(세컨드파티 퍼블리싱)을 하지만, 인도에서는 3PP(서드파티 퍼블리싱)을 한다”고 부연했다.
|
中게임시장 고착화…韓 노동제도, 게임 산업 성장 저해
글로벌화에 집중하고 있는 크래프톤. 중국 대신 인도를 선택한 이유는 뭘까. 장 의장은 “중국 시장은 여전히 중요한 시장”이라면서도 “다만 중국 시장은 산업 생태계가 고착화됐다. 중국에서 제대로 성공하려면 텐센트든 넷이즈든 서비스와 플랫폼 홀더를 거쳐야 한다. 또, 중국 게임 제작사들의 역량과 경험이 많이 쌓여있어 한국 게임 제작사들이 더 낫다고 보기도 어렵다. 게다가 중국 게이머들은 중국 제작사들의 게임을 더 친숙하게 느낀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 게임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면 중국 시장에 쉽게 진출하기 어렵다. 반면에 인도는 플랫폼 홀더가 아직 힘이 약하고 ‘춘추전국시대’ 느낌이다. 강력한 플랫폼 홀더가 등장할 가능성도 낮다. 중국과는 정치 체제도 다르다. 인도에는 게임 제작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한국의중소형 제작사들에게도 유망한 시장”이라고 했다.
그는 “인도 시장에 진출할 때는 인도 특유의 문화와 취향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은 일본풍 아니메 스타일(アニメ·특정 스타일의 일본 애니메이션)을 쉽게 받아들이나, 인도는 그렇지 않다. 한국 게임사의 역량을 고려할 때 노력할 가치가 있는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특정 시장에만 의존하는 것은 힘들다. 여러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면서 “굳이 노려야 한다면 새로 성장하는 시장을 노려야 한다. 한국은 성숙한 시장이지만 인도는 아직 개발 중인 시장이다. 한국 시장만을 위한 건 우리가 못하는 게 현실이고, 우선순위가 높지는 않다. 외면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3천 여명의 임직원 중 3분의 1은 한국 국적이 아니다. 아직은 글로벌 회사로서의 위치를 갖추지 못했지만,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한국 게임사들이 중국 게임사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로 노동제도를 꼽기도 했다.
장 의장은 “조금 민감한 얘기다. 노동제도가 영향을 많이 미친다”면서 “북미 정도의 노동 유연성은 필요 없더라도, 지금처럼 너무 딱딱하면 게임 프로젝트에 실패해도 인력 재배치가 너무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부터니까 한 7년은 됐다. 그 전까지는 대화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풀어갈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닫혀 있다. 저희 같은 업은 변화가 빠르고,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이기도 해서 노동경직성이 10년, 20년 이상 되면 게임 인더스트리도 경쟁력을 많이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위기감을 갖고 있다. 산업별 노동제도를 다르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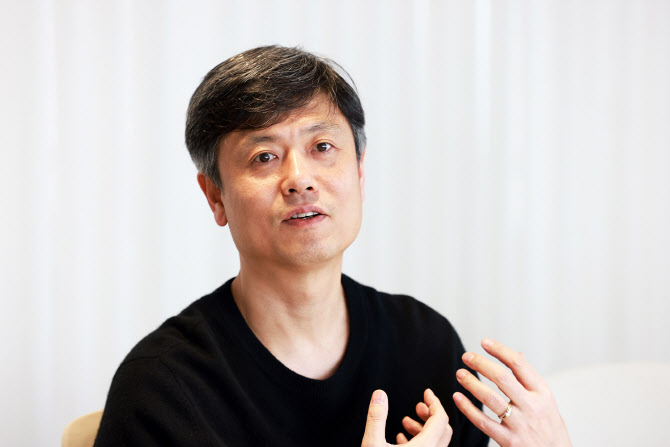







![아침 출근길 영하권 추위…수도권 포함한 곳곳에 '첫눈' 내린다[오늘날씨]](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1/PS24112700027t.jpg)
![친누나 11차례 찔러 죽이려한 10대에...법원 “기회 주겠다”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1/PS24112700001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