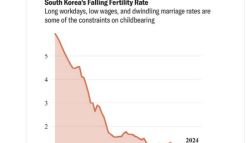|
메세 뒤셀도르프는 1994년 첫 선을 보인 이 박람회를 30년 만에 출품료 수입만 한해 100억 원이 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행사를 키웠다. 프로바인 행사 하나로 인구 62만의 뒤셀도르프시(市)가 얻는 직접 경제효과는 수천억 원에 달한다.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뒤셀도르프 전시장에서 열린 ‘프로바인 2024’ 현장에서 만난 피터 슈미츠 메세 뒤셀도르프 이사는 “프로바인은 이탈리아와 프랑스, 스페인에 가려 평범한 와인 생산국에 머물던 독일을 업계와 전문가가 주목하는 와인산업의 글로벌 중심지로 바꿔 놓았다는 평가를 받는 행사”라고 소개했다.
|
올해 30주년을 맞은 프로바인에는 전 세계 60개국에서 5700개 기업이 참여했다. 독일에서 세 번째로 큰 뒤셀도르프 전시장(30만5700㎡) 19개 홀 가운데 13개 홀에서 열린 행사를 찾은 방문객은 5만여 명. 전시장 입구에서 만난 암스테르담에서 주류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크리스토퍼 마쉰은 “매년 프로바인에서 새로운 공급처와 제품 정보를 얻고 있다”며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증류주(스피릿)를 보기 위해 세계 각국 증류주를 모아 놓은 프로스피릿(ProSpirits)관을 둘러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유럽 최대’라는 수식어가 어색하지 않지만 프로바인의 시작은 초라했다. 이미 자리를 잡은 이탈리아 베로나 ‘빈이탈리’(VinItaly), 프랑스 보르도 ‘빈엑스포’(Vinexpo)에 밀려 등장과 동시에 ‘후발주자’라는 딱지가 붙었다.
|
프로바인은 1994년 올해 대비 18분의 1 수준인 출품업체 9개국 321개사로 시작했다. 이듬해 규모를 두 배 가까이 불린 프로바인은 4년 만인 1997년 출품업체 1000개 고지를 돌파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몸집이 불어나는 프로바인의 기세에 빈이탈리, 빈엑스포가 양분하던 시장은 3자 경쟁 구도로 바뀌었다.
한달 전 파리 베르사유 전시장에서 열린 와인파리·빈엑스포에 이어 프로바인에도 출품한 프랑스 와인잔 제조회사 관계자는 “두 행사가 방문객부터 전체적인 행사 분위기가 다르다”며 “와인파리·빈엑스포는 B2C 콘셉트의 로컬 이벤트 성격이 강한 반면 프로바인은 방문객 국적이 다양하고 대부분이 업계 종사자”라고 했다.
|
프로바인이 와이너리 하나 없는 뒤셀도르프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던 건 기획 단계부터 B2B에 초점을 맞춘 덕분이다. 프로바인은 B2B 콘셉트로 B2C 성격이 강한 빈엑스포, 빈이탈리의 틈새를 파고들었다. 후발주자로써 택한 차별화 전략은 30년간 일관되게 유지되면서 ‘비즈니스는 프로바인’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일등공신이 됐다.
B2B를 최우선으로 삼는 만큼 모든 행사는 비즈니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행사를 빈엑스포, 빈이탈리보다 한 달가량 빠른 3월에 여는 이유도 도매에서 소매로 이어지는 B2B 유통과정을 고려해서다. 본사는 물론 각 지사와 대표부에선 매년 전체 마케팅 비용의 80~90%를 출품업체 모집이 아닌 바이어 발굴에 쏟아붓고 있다. 행사 기간 진행되는 포럼, 세미나는 물론 전시 종료 이후 부스에서 별도로 열리는 샴페인 파티도 즐기고 마시는 파티가 아닌 와인을 테스팅하는 비즈니스가 목적이다.
박정미 메세 뒤셀도르프 한국대표부 대표는 “프로바인은 물론 메쎄 뒤셀도르프가 여는 모든 산업 전시회의 모토는 ‘정확한 출품업체, 정확한 바이어’(Right Exhibitors, Right Buyers)”라며 “매 행사마다 전 세계 83개 지사와 대표부 네트워크를 활용해 양질의 바이어를 행사장까지 오게 만드는 작업에 가장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
슈미츠 총괄 디렉터는 “산업 리포트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정확한 시장 정보와 트렌드를 담는 것이 중요하다”며 “매년 무료로 배포하는 리포트가 프로바인이 일년에 단 사흘간 열리는 B2B 행사가 아니라 일년 내내 산업을 리드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동시에 행사에 대한 로열티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