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오현주 선임기자] “사십 년을 그림과 술로 살았다. 그림은 나의 일이고 술은 휴식이니까. 나는 내 몸과 마음을 죽을 때까지 그림을 그려 다 써 버릴 작정이다. 남은 시간은 술을 마시고.”
화가 장욱진(1917∼1990). 유일하게 남긴 에세이집 ‘강가의 아틀리에’(1976)에는 두 줄기가 곧 전부다. 그림과 술. 얼마나 그림과 술에 빠져 있었으면 술 이야기가 잔뜩인 이 꼭지의 제목이 ‘아이 있는 풍경’일까. ‘아이 있는 풍경’은 장욱진이 1973년에 그린 그림이기도 하다. 결국 작정대로 했다. 화가는 그릴 수 없을 때까지 그림을 그렸고 마실 수 없을 때까지 술을 마셨다.
그림과 술이 인생의 전부인 가장. 집안 사정이 어땠을지는 보지 않으려 해도 보인다. 화가의 아내는 남편을 대신해 돈벌이에 나섰고 자식들을 교육했다. 그런데도 이 화가, 평생 가장 많이 그린 그림이 ‘가족’이다. 맏딸 장경수(72) 경운박물관장은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고한다.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한 것에 죄책감이 있었다”고. “아버지의 가족사랑은 늘 화목하게 보이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자식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항상 해 형제들이 아버지를 가엾이 여겼다”고.
|
▲향토색 절제미로 무장한 ‘가족·까치·나무’
박수근(1914∼1965), 이중섭(1916∼1956)과 더불어 한국근현대미술 대표작가로 이름을 올린 장욱진. 올해는 그가 태어난 지 100년째다. 단명한 선배들에 비해선 흔적이 길다.
비교적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 보탬이 됐을 거다. 1917년 충남 연기군 동면의 대지주가문 4형제 중 차남이었다. 그가 평생 ‘가족’ 곁에 둔 ‘까치’는 어린 장욱진을 미술로 뛰어들게 한 계기가 됐다. 몸이 온통 까맣고 눈만 하얀 ‘까치’ 그림이 ‘전일본소학교학생미전’에서 1등을 차지했던 거다. 본격적인 화가의 길은 1939년 도쿄제국미술학교 서양화과에 입학하며 시작됐다. 한국전쟁 이후 서울대 미대 교수(1954∼1960)를 지내기도 했으나 6년 만에 때려치우고 오로지 창작에만 몰입했다.
|
향토색 물씬 풍기는 한국적 소재와 주제, 소박한 조형미는 박수근·이중섭과 닮았다. 그러나 화풍은 전혀 달랐다. 마치 아이가 그린 듯한 단순한 절제미가 무기였던 거다. 까치와 가족은 물론 새·나무·집·마을·소·닭 등 목가적인 소재는 극단적인 ‘심플’로 무장한 채 세상과 연결되거나 세상과 거리를 뒀다. 지극히 자연적이고 지극히 상징적인 평면성이었다.
▲“이거 하나 그려놓고 인연 끊으려 했나”
서울 종로구 인사동 인사아트센터에 장욱진의 세상이 펼쳐졌다. ‘장욱진 100년, 인사동 라인에 서다’ 전이다. 가나문화재단이 장욱진미술재단과 손을 잡고 그간 한자리에 모으기 힘들었던 유화·먹그림·서각 등 100여점을 전시장 3관에 털어 걸었다.
전시는 연대기별로 장욱진 작품세계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케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덕소시절(1963~1975), 명륜동시절(1975~1979), 수안보시절(1980~1985), 신갈시절(1986~1990)이다. 전기도 수도도 없던 곳에서 홀로 머물던 덕소시절에는 외로움이 잔뜩 묻어 있다. 가족과 함께 살았다는 명륜동·수안보시절에는 그나마 화목한 그림이 많다. 신갈시절로 넘어오면 유유자적이다. 마치 생을 달관한 사람처럼. 작품색도 짙어졌다. 물감을 많이 쓸 수 있던 시절이었다.
|
소장자가 미국에서 가지고 있던 ‘나무와 새와 모자’(1973), ‘팔상도’(1976)를 처음 공개한다. 가족도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작품이다. 캔버스 위에 먹으로 그린 수묵화를 보는 것도 수확이다. 일필휘지의 순발력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이들 작품을 두고 장욱진은 “붓의 흔들림이 너무 좋다. 이제 멈춰야겠다”고 했다던가. 아주 드문 추상화라고 할 ‘눈’(1964)도 한쪽에 고즈넉하게 자리를 잡았다.
작가 최고가 기록을 세우며 올봄 서울옥션에서 7억원에 팔린 ‘독’(1949)은 나오지 못했다. 대신 2014년 같은 경매서 5억 6000만원에 낙찰된 ‘진진묘’(1970)는 볼 수 있다.
‘진진묘’의 일화는 짚지 않을 수가 없다. 부인 이순경(98) 여사의 법명이 진진묘다. 다른 화가는 부인의 초상을 잘도 그려준다는데 왜 나는 안 그려주느냐는 아내의 푸념에 화가가 붓을 들었단다. 그런데 내놓은 그림을 보니 웬 부처상이 떡하니 들어 있는 게 아닌가. 이 그림을 그리고 장욱진은 석 달여를 지독히 앓았다. 부인이 ‘진진묘’를 좋아하지 않은 이유란다. “이거 하나 그려놓고 나와의 인연을 끊으려나 보다” 했다고.
|
▲‘술 골목’ 인사동을 다시 찾다
장욱진 100년이 굳이 ‘인사동’에 들어선 게 슬쩍 와닿는가. 그림이 안 될 때 “숯돌에 몸을 갈 듯 술을 마셨다”는 화가에게 인사동은 가장 친밀한 술 골목이었단다. 이 골목 저 골목을 헤집으며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집까지 데려다 줄 사람이 반드시 있다”고 “내 라인은 인사동!”을 외쳐댔다는 거다.
술과 그림에 취해 살던 장욱진을 두고 장 관장은 “우리 형제들은 아버지가 으레 나를 제일 좋아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그랬을 거다. 애잔함이 없었다면 가족이 그이 인생 전반을 휘두른 키워드는 될 수 없었을 거다.
|
알다시피 장욱진의 화첩에는 큰 그림이 없다. 손 폭에서 벗어나는 건 지배할 수 없는 능력이라고 믿은 철학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완성한 건 쪼그려 앉은 자세였다. 그의 그림 대부분은 두 무릎 사이에 세운 세필에서 나왔다.
‘강가의 아틀리에’로 돌아가 볼까. “그림처럼 정확한 내가 없다. 난 그림에 나를 고백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발산한다. 내년 봄에 전시회를 약속했더니 그림을 통 못 그리겠다.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면 짐스러워지고 그게 꼭 그림에 나타난단 말이야.” 그가 미처 약속하지 못했던 이번 전시는 뜨거운 여름 내내 이어진다. 8월 27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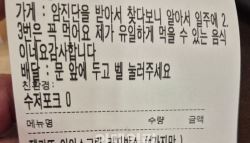

![아파트에서 숨진 트로트 여가수…범인은 전 남자친구였다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1/PS2411300000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