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 부부는 정비구역 내 한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지난 2019년 9월 A씨를 대표 조합원으로 분양을 신청했다. C씨도 정비구역 내 다른 주택을 소유해 단독으로 분양신청을 했다. A씨는 주민등록상 단독 세대를 구성한 세대주였으나, B씨와 C씨는 A씨의 아버지를 세대주로 한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었다. 실제 B씨는 미국에, C씨는 한국의 다른 곳에 거주 중이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옛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따라 이들이 모두 하나의 세대에 해당한다면서 1개 주택만을 분양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성남시 인가를 받았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원고들은 각각 별개의 세대를 이뤄 독립된 생활을 한 것이어서 하나의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작성된 주민등록표 등을 기준으로 동일 세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1심을 뒤집고 원심 패소 판결했다.
대법은 2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은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았던 이상 이들을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관계라고 할 수 없고 ‘하나의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묶여 있다고 해도 함께 생활하거나 하지 않으면 동일 세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은 “주민등록표 등재 등 형식만을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면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면서도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 달리 두고 있는 경우 여러 채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이른바 ‘위장 세대 분리’를 막지 못하는 폐단이 발생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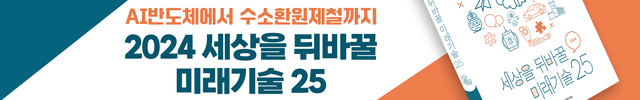



![[단독]배우 김소은 "축구선수 정동호와 결혼 전제 열애? NO…황당"](https://spn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04/PS25042300098t.jpg)
![시작은 이랬는데..20년된 유튜브 첫 영상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04/PS25042400004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