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족의 항일투쟁사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이름들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한때 러시아 연해주에 터전을 잡고 일본군에 맞서 싸우는 한편 동포들을 계몽해 국권 회복의 꿈을 키웠다는 것이다.
|
그러나 얼마 후 위기를 맞았다. 러시아혁명 후 내전이 벌어진 틈을 타 연해주를 점령한 일본군은 1920년 고려인(러시아 이주 한인)들의 집단 거주지인 신한촌을 불태우고 최재형을 비롯한 독립운동 지도자들을 학살하는 ‘4월 참변’을 저질렀다.
내전이 끝난 뒤 소련 정부는 태도를 바꿔 고려인들의 무장 항일투쟁을 막았다. 그런 가운데서도 두만강을 건너 연해주로 이주하는 동포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고려인 학교를 세우고 한글 신문·잡지를 발간하며 희망의 불씨를 살리려 애썼다.
1937년에는 더 큰 비극이 닥쳤다. 스탈린 정권의 강제이주 정책에 따라 고려인 약 17만 명이 시베리아 횡단열차에 짐짝처럼 실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지로 끌려갔다. 이에 앞서 지도자급 인사 2500여 명이 간첩 누명을 쓰고 처형됐다.
중앙아시아에 새롭게 뿌리내린 고려인들은 해방 후에도 냉전과 분단 탓에 모국과 단절된 채 살아야 했다. 1991년 소련 해체 후 독립국가연합(CIS) 각국과 한국의 수교로 끈이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지만 세대를 거치는 동안 연해주와 시베리아에 있던 항일투쟁 자취는 사라지고 고려인 독립운동가에 대한 기억도 희미해졌다. 후손들마저 각지에 흩어지거나 대가 끊겼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내에서는 고려인 독립운동가에 대한 기념사업회가 대부분 꾸려져 있지 않고 기념관이나 기념비도 찾아보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고려인 지원단체 너머는 3·1운동 100주년에 맞춰 고려인 독립운동가들을 한꺼번에 기리는 기념비 건립을 제안하고 시민사회단체 등과 힘을 합쳐 돈을 모았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악재가 겹쳐 어려움을 겪었다. 2023년에는 정부가 홍범도의 공산주의 이력을 빌미로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흉상을 옮기려고 시도해 고려인 독립운동가 현양 분위기를 위축시키기도 했다.
기념비 건립은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광복 80주년을 맞는 2025년에야 결실을 봤다. 지난 4일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 국내 최초로 세워진 고려인 독립운동 기념비는 가로 3.8m, 높이 3.2m, 무게 12.9t의 화강암과 오석에 ‘1919’라는 숫자와 함께 ‘굴복하지 않는 고려인의 용기’라는 글귀를 한글과 러시아어로 새겼다. 한글 글씨는 김봉준 화백이 썼다.
제막식에는 신은철 너머 이사장과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와 안산시민, 귀환 고려인들이 참석했으며 독립유공자 허위, 마춘걸, 김경천의 후손들도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안산에는 국내 고려인 동포 약 11만 명 가운데 가장 많은 2만3000여 명이 살고 있다.
홍범도, 이동휘, 김알렉산드라, 계봉우, 조명희 등 고려인 독립운동가의 상당수가 공산주의자와 손잡긴 했어도 그것은 일제를 몰아내려 한 수단이었고 지금의 잣대로 재면 안 된다. 이들의 후손은 자의로 이념이나 국적을 선택하지도 않았다. 우리는 고려인 독립운동가들에게 빚진 것이 많고 후손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품어야 마땅하다.
고려인 독립운동 기념비는 고려인들에게는 자긍심을 안겨주고 국민에게는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는 상징물이자 교과서다. 나아가 고려인을 포함한 각국 재외동포들의 독립운동 현양 사업을 촉발하는 마중물 구실도 함으로써 전 세계 한민족이 하나 되는 실마리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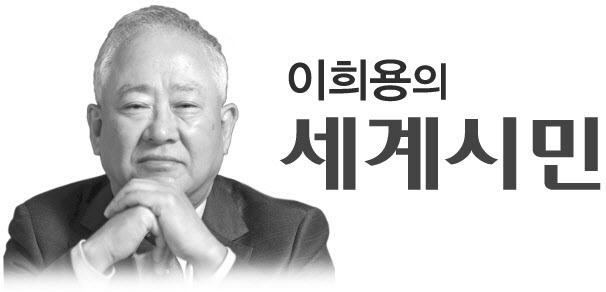
!['36.8억' 박재범이 부모님과 사는 강남 아파트는[누구집]](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2/PS26021500062t.jpg)

![설에 선물한 상품권, 세금폭탄으로 돌아온 까닭은?[세상만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2/PS26021500108t.jpg)

![조상님도 물가 아시겠죠… 며느리가 밀키트 주문한 이유[사(Buy)는 게 뭔지]](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2/PS26021500087t.jpg)